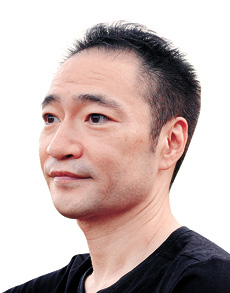제가 처음 한국 요리를 먹은 것은 1991년, 멕시코시티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본 친구들에게 이끌려 맛있는 야키니쿠를 먹으러 ‘Pabellon Coreano(한국의 파빌리온)’이라는 가게에 갔습니다. 그것은 정말 먹어본 적 없는 좋은 맛이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 점원이 뼈가 붙은 갈비를 가위로 쓱쓱 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위로 식재료를 자르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가위로 자르니까 편리하다!’ 싶은, 신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위에 관한 문화적 충격
대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한국에서는 식재료를 자를 때 가위를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가위라고 하니, 외국에 살면서 난처한 일 중 하나가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언어가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을 때 미용실에서 어느 길이로 자르면 좋을지 주문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미용사의 자르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멕시코에서는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스타일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비슷한 듯 아닌 듯 이상한 머리 모양이 되었습니다. 몇 곳이나 미용실을 바꿔서 다녀봤지만, 제가 희망하는 머리 모양은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저는 단발이었기 때문에(지금은 스킨헤드)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단발도 창의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어를 거의 몰랐기 때문에(지금도 못하지만요), 일본 기업의 주재원으로부터 자이니치(재일교포-옮긴이) 미용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일본어 네이티브라서 대화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헤어스타일을 주문해도 알아듣지 못했고, ‘저한테 맡겨주면 인생을 바꿔드리겠다’며 강력하게 허락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머리는 짧습니다. 그렇게 변화무쌍한 헤어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있다고 하면…, 힙합 댄서 같은 모습의 제 머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짧게 해 주세요.”
“그래요…. 인생을 바꿀 엄청난 찬스였는데, 아쉽네요.” 미용사는 아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미용사도 이상한 가위질 방식을 썼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머리 모양은, 내가 상상했던 단발이 아니라, 굳이 비유하자면 민들레 갓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국어로 ‘민들레 머리’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용사의 말에 따랐다면, 인생이 크게 바뀌어 빛나는 미래를 맞이했을 테니까요.
지금은 바리캉을 사서 설정을 2밀리미터로 하고, 매주 욕실에서 혼자 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람 만날 일도 없는데 머리를 단정히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졌고, 불필요하게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깎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에 살아도 머리를 깎느라 고민할 일은 없겠지요.
미디어의 폭력 묘사
가위의 나라 한국에서 칼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영화 속의 조폭들일지도 모릅니다. 난투가 벌어지면 거의 모두가 커다란 칼을 뽑아 들고 싸웁니다. 현실의 야쿠자, 조폭이 칼만 들고 싸우는 일은 적을 테니까, 이것은 영화 속 세계에 한정된 이야기겠지요. 미국의 마피아 영화에서는 총이 나오고, 일본의 야쿠자 영화에서는 작은 단도나 주먹이 메인인데, 한국 폭력 영화엔 거의 큰 칼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칼이라야 피가 철철 흐르기 때문이겠죠.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화려한 장면을 만드는 데 특화돼 있기 때문에 폭력 장면에서는 피의 양이 엄청나지요. 일본 영화 중에도 시대극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칼로 난투극을 벌입니다만, 한국 영화의 현대극에서는 조폭의 조무래기도 우두머리도 모두가 칼을 휘두릅니다. 그중에서도 이채로움을 발하는 것이 ‘마블리’ 마동석입니다. 마블리만은 총도 칼도 사용하지 않고, 주먹 하나로 적을 때려눕힐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눈에 띄죠.
멕시코 마피아 영화에 등장하는 마약 카르텔의 조직원들, 즉 나르코스(narcos)는 보란 듯이 총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고, 목을 잘라 다리에 매답니다. 영화뿐 아니라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2010년 무렵부터 나르코스 항쟁이 격화돼 멕시코 방방곡곡에서 사람이 죽고 효시됐습니다.
멕시코에는 아즈텍 문명 시대에 심장을 꺼내거나 참수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기에 만들어진 교회에 가면, 목이 잘린 성인의 초상이나 그림이 있습니다. 게다가 멕시코의 신문은 매일같이 1면에 죽임당한 사람의 유체 사진을 크게 싣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시체 사진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나르코스의 잔혹성을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일본 영화에서는 잔혹한 장면은 너무 그로테스크하게 그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에는 달라졌습니다. 영화보다 먼저 만화가 그렇게 변화했습니다.「진격의 거인」,「킹덤」,「골덴 카무이」등등의 작품에서, 몸이 잘리거나 산산조각이 나는 장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잔혹하게 그려집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소재로 한 최근의 일본 영화에선 서로 베고 찌르는 것이 강조됩니다.
유혈의 상품화와 의존성
제가 그로테스크한 묘사의 바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학 드라마나 영화의 수술 장면입니다. 세계적으로 의학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고 수술 장면이 점점 사실적으로 표현되면서, 절개와 출혈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제가 아직 젊었던 1980년대에는 스플래터 무비라는 장르가 유행했습니다. 몸을 자르고 도려내는 장면이 대량의 피와 함께 그려지는 타입의 호러 영화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스플래터 무비가 아닌 이상 그런 그로테스크한 묘사는 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호러 영화가 아니라 액션 영화나 의학 영화에서도 예전의 기준으로 보자면 스플래터 무비에 가까운 묘사가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로테스크한 묘사를 상품으로 삼는 작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묘사에는 의존성이 있어서 더 과격한 것을 추구하게 돼버리니까요. 그런 부분에 의존을 유혹하는 장치를 두는 것은 야비한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위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영화의 그로테스크한 묘사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잡담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산책하듯 써봤습니다. ‘목적을 향해 똑바로 나가는’이라는 자세가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분단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회차에는 그 이야기를 해볼 참입니다.
■ 번역 김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