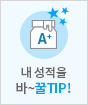「불멸의 여자」 포스터와 최종태 감독. 사진 제공=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민낯을 고발하는 한 편의 영화가 4월 5일 관객을 찾아왔다. 동명 연극을 원작으로 한 영화 「불멸의 여자」(최종태 감독)는 손님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강요당하는 화장품 판매사원 ‘희경(이음)’과 눈가 주름방지용 화장품 반품을 요구하는 갑질 손님 ‘정란(윤가현)’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파격 잔혹극이다.
직접 겪는 듯한, 숨 막히는 몰입갑
최종태 감독의 영화동아리 후배인 봉준호 감독은 「불멸의 여자」를 보고 “극한의 감정노동을 직접 겪어보는 듯한, 숨 막히는 몰입감을 느꼈습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고밀도의 전개뿐 아니라, 연극무대라는 세팅을 5분 만에 잊게 만드는 예리한 카메라 워크, 편집, 음악 등 풍성한 영화적 표현들 덕분에 하나의 ‘씨네마’로 남게 되는 작품 같아요”라고 극찬을 보냈다.
끊임없는 서비스 착취로 노동자의 삶과 자본의 폭압적인 구조를 고발하는 「불멸의 여자」를 만든 최종태 감독은 감정노동의 문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를 잃어버린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란 대사는 연극에 없었던 대사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혁명도 돈이 되면 이용한다’라는 말이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순결성이 사회가 점점 상업화되면서 희석되는 겁니다.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널 사랑해’라는 말이 값싸고 쉬운 말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단어는 사랑뿐이 아닙니다. 행복, 꿈, 웃음도 마찬가지죠.”
「불멸의 여자」에서는 이런 점을 CCTV로 표현하고 있다. 조지 오웰 소설의 ‘빅브라더’처럼 감정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용한 화장품을 환불해달라고 막무가내로 갑질을 하는 정란은 CCTV 앞에서 떳떳하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희경과 승아가 자신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멸의 여자」는 사랑, 꿈, 행복, 웃음, 친절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상품화한 시스템, 즉 자본주의의 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영화인 셈이다.
본래의 가치 잃은 사랑, 꿈, 행복
여기에 최 감독은 ‘가면’이라는 개념을 덧붙였다. 영화에서도 가면을 쓴 사람들이 등장인물 사이를 휙휙 가로질러 간다. 최 감독은 “요즘 사회는 불투명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몇 개씩 가면을 써요. 국가도, 기업들도 가면을 쓰니 무엇이 진짜인지 확인하지 못하죠. 예전에는 ‘정의’라고 하면 그 반대에서 ‘억압’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올랐다면, 지금은 가치를 잃은 상황에서 가면까지 쓰니 본질을 알아본다는 것이 쉽지 않게 된 겁니다. 건강한 나무들이 모여야 건강한 숲이 되죠. 나 말고는 다 적이라는 가치관보다 ‘함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무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함께’라는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최 감독은 ‘다정함’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엔딩곡 제목도 「다정」이다.
“감정노동이 진짜 노동이 되지 않으려면 다정함에 대한 인문학적인 학습이 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정함이 주는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자신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은 그렇게 서로 기분이 좋은 거죠. 앞으로 다정함이야말로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큰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또 모를 일입니다. 자본주의가 다정함이라는 가치마저 사라져버리게 할지도요”라며 씁쓸해했다.
감정노동의 착취 문제를 다루며 화제를 모았던 동명의 연극 작품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연극 무대를 스크린으로 옮긴 ‘씨네마 인 씨어터(Cinema in Theater)’를 시도하며, 값싼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영화를 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연극에 출연한 배우들 역시 그 역할 그대로 영화에 나온다. 2022 웨일즈국제영화제(WIFF)에서 ‘베스트극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